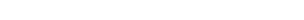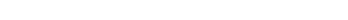전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맞춰 환경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석유화학 소재 대신 식물과 미생물 등 재생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연료나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화이트바이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화이트바이오는 옥수수와 콩 등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만든 화학제품이나 바이오 연료 등을 뜻한다. 화이트바이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어드로이트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화이트 바이오 산업 시장규모는 2019년 2378억 달러(315조원)에서 2028년에는 5609억 달러(742조원)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화이트바이오의 시장 확대는 전세계에서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져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해 6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법안을 통과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나라의 제품에 강제 부담금을 매기는 것으로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의무보고가 실시된다. 탄소 배출량 보고만 시행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품 제조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시도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대안중 하나로 꼽히는 화이트바이오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고 원료인 식물 등 바이오매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점에서 탄소 중립적이라는 평가다.
국내에서는 정유·석유화학 업계가 화이트바이오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이다. 화학제품을 주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당장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계이기 때문이다. SK케미칼, 포스코인터내셔널, GS칼텍스,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등 업체들이 미래 친환경 사업 육성 차원에서 화이트바이오를 육성하고 있다.
주로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화이트바이오 분야 내에서도 바이오플라스틱과 바이오에탄올에 집중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미생물의 체내에 있는 폴리에스터를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이다.
석유화학 플라스틱인 비닐과 페트병은 자연 분해되려면 수십년이 걸리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야기시킨다. 그러나 바이오플라스틱은 최대 5년 안에 자연분해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바이오에탄올은 곡물을 활용해 만든 재생연료다. 연소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라는 평가다.
식품·소재 기업들도 화이트바이오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거듭해왔고 상당수의 성과를 얻어내왔다. CJ제일제당, 대상, 삼양홀딩스 등 업체들은 본업인 식품·소재 부문과 화이트바이오가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식품 시장 성장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식품·소재 업체들은 소재 부문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석유계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 부가가치가 높은 스페셜티 소재 개발 등이다.
다만 국내 업체들의 투자와 육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이트바이오 선도 국가와의 기술 격차는 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0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및 ‘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등 화이트 바이오산업 관련 핵심 기술의 경쟁력은 미국 대비 각각 3년, 4년의 격차가 있다. EU나 일본과 비교해도 국내 기술력은 낮은 수준이며 미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볼 때 78~85%에 그친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해 올해부터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활성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화이트바이오 핵심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27년까지 화이트바이오 신생기업 2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